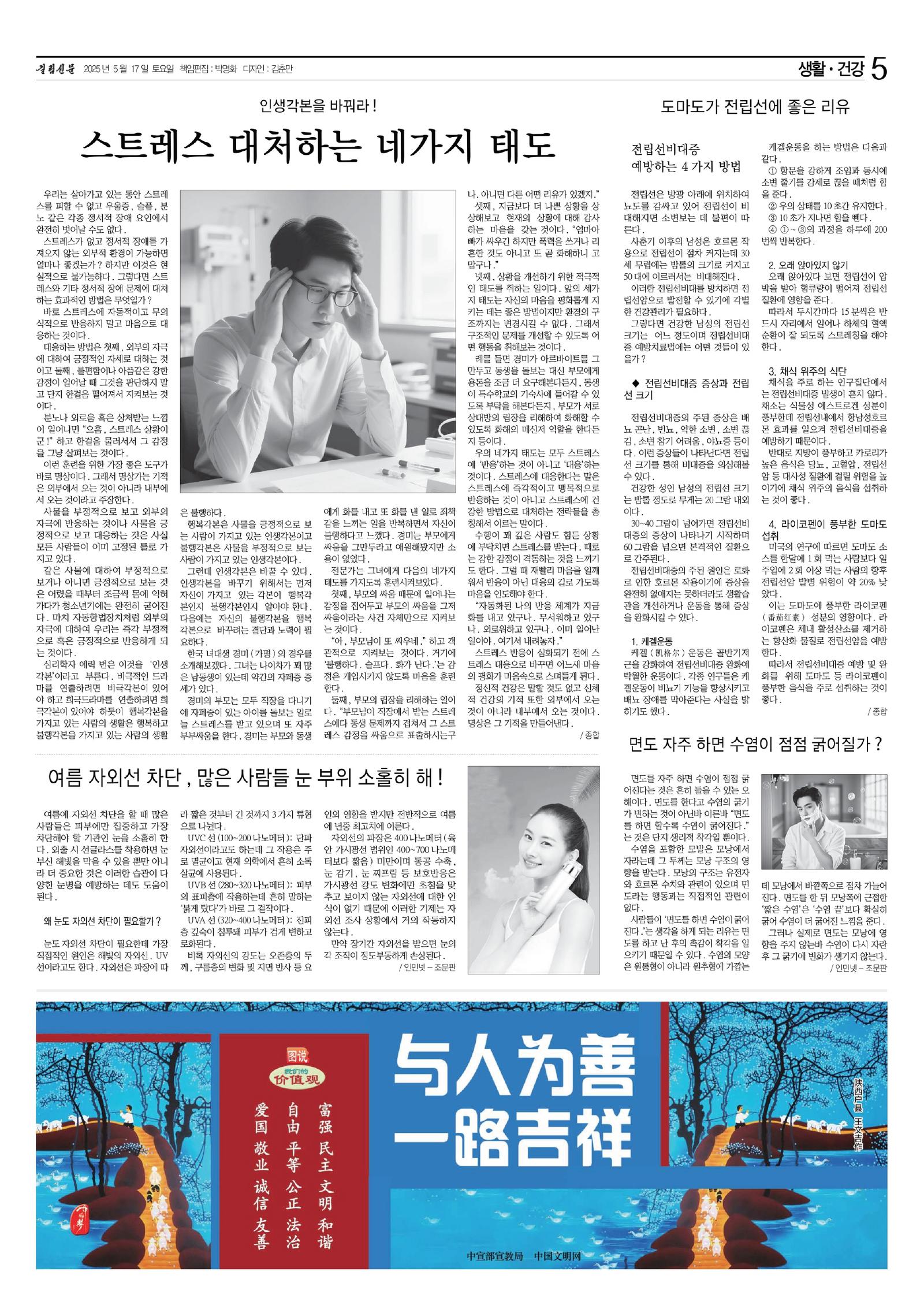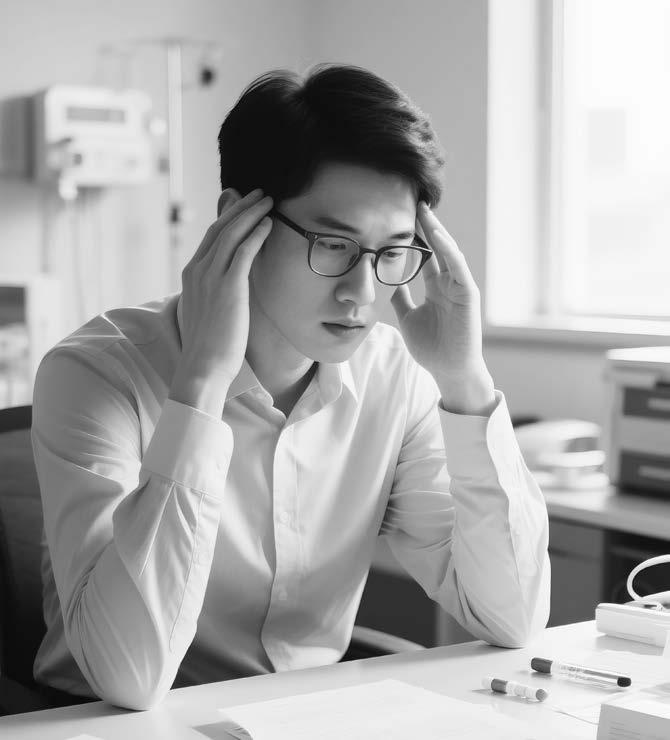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고 우울증, 슬픔, 분노 같은 각종 정서적 장애 요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
스트레스가 없고 정서적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 외부적 환경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기타 정서적 장애 문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가?
바로 스트레스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대응하는 방법은 첫째,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이고 둘째, 불편함이나 아픔같은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한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다.
분노나 외로움 혹은 상처받는 느낌이 일어나면 “으흠, 스트레스 상황이군!” 하고 한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그냥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가는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나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고정된 틀로 가지고 있다.
같은 사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몸에 익혀가다가 청소년기에는 완전히 굳어진다. 마치 자동항법장치처럼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우리는 즉각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이것을 ‘인생각본’이라고 부른다. 비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려면 비극각본이 있어야 하고 희극드라마를 연출하려면 희극각본이 있어야 하듯이 행복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행복하고 불행각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하다.
행복각본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각본이고 불행각본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각본이다.
그런데 인생각본은 바꿀 수 있다. 인생각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본이 행복각본인지 불행각본인지 알아야 한다. 다음에는 자신의 불행각본을 행복각본으로 바꾸려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녀대생 경미(가명)의 경우를 소개해보겠다. 그녀는 나이차가 꽤 많은 남동생이 있는데 약간의 자페증 증세가 있다.
경미의 부모는 모두 직장을 다니기에 자페증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 자주 부부싸움을 한다. 경미는 부모와 동생에게 화를 내고 또 화를 낸 일로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경미는 부모에게 싸움을 그만두라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는 그녀에게 다음의 네가지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시켜보았다.
첫째, 부모의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을 접어두고 부모의 싸움을 그저 싸움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아, 부모님이 또 싸우네.” 하고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거기에 ‘불행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는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한다.
둘째, 부모의 립장을 리해하는 일이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다 동생 문제까지 겹쳐서 그 스트레스 감정을 싸움으로 표출하시는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리유가 있겠지.”
셋째,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상상해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엄마아빠가 싸우긴 하지만 폭력을 쓰거나 리혼한 것도 아니고 또 곧 화해하니 고맙구나.”
넷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다. 앞의 세가지 태도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데는 좋은 방법이지만 환경의 구조까지는 변경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다.
례를 들면 경미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는 대신 부모에게 용돈을 조금 더 요구해본다든지, 동생이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본다든지, 부모가 서로 상대방의 립장을 리해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등이다.
우의 네가지 태도는 모두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응한다는 말은 스트레스에 즉각적이고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전략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수행이 꽤 깊은 사람도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때로는 강한 감정이 격동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 재빨리 마음을 일깨워서 반응이 아닌 대응의 길로 가도록 마음을 인도해야 한다.
“자동화된 나의 반응 체계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여기서 내려놓자.”
스트레스 반응이 심화되기 전에 스트레스 대응으로 바꾸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정신적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 건강의 기적 또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명상은 그 기적을 만들어낸다.
/종합